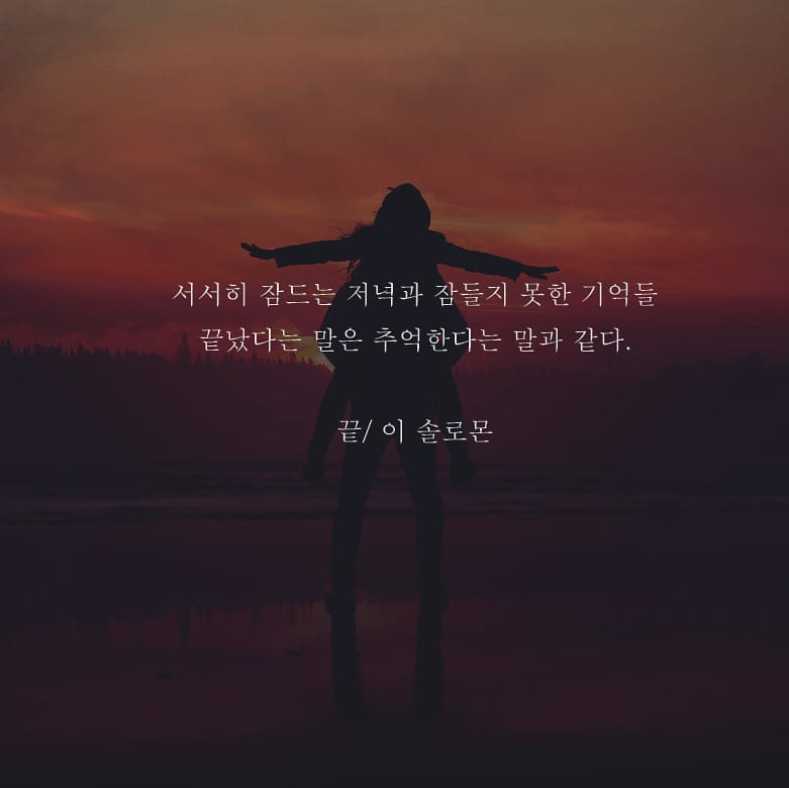
unknown__wrt * * * *
⠀
끝났다는 말은 추억한다는 말과 같다.
끝이라는 말은 무르익은 기억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더 일정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더는 같은 형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끝이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이자
공간의 마지막
사물의 가장자리이다.
무언가의 끝에 다가가서 그 가장자리에 서면
자연히 뒤를 돌아보게 된다.
마감 기한에 다다른 일과 혈기왕성한 졸업의 냄새
표정 없는 사직서와 짧게 불타오른 연인
지나온 삶과 쏟긴 노력
서서히 잠드는 저녁과 잠들지 못한 기억들
더는 맞이할 수 없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밤
얼굴 없이 웃는 그림자 같은
끝났다는 말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어진 시간이 모여
빛을 내는 별과 같은 말
아름다움으로 추억하고자 우리가 꾸미는
쓸쓸한 트리 위 홀로 선
별과 같은 말.
끝/ 이 솔로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B3ZNEzTl2sP/
---
'추억'의 의미론적 정의엔 끝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끝'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항상 추억을 포함하진 않는다.
추억은 끝이 나야 할 수 있지만, 끝이 나도 추억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의의 방향이 일방적인 두 단어를 굳이 같다고 하는 이 글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끝의 무게가 느껴졌다.
난 끝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부정을 항상 '못'으로 생각했었다.
다시는 '못' 보는, 이젠 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쉬운.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가볍게, 예전의 나는 '못함의 아쉬움'에 대해 얘기했던 것 같다.
아쉬움을 한껏 머금어도 그리 버겁지 않은 무게의 끝들이었다.
하지만 그 덩치가 밤하늘 같던 끝을 삼켜내야 했을 때
나는 '못'이란 말도 같이 몸 깊숙이 삼켜버린 것 같다.
'못함'을 입 밖으로 토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다.
난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울멍한 얼굴을 변명 삼았었는데,
사실 무너질 것 같았던 건 내가 겨우 쌓아 올린 괜찮다는 말들이었다.
작가는 끝을 '더 일정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
더는 같은 형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이라 형용한다.
'못함'이 아닌 '않아도 됨'이라 정의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깜깜한 밤하늘 같던 끝을 별이라 표현하는 것에서도.
별은 돌이킬 수 없기에 빛이 난다. 그리고 끝이 났기에 추억을 한다.
그럼에도 참 아픈 글이다.
별에 초점을 두었지만 쓸쓸한 트리가 보이는,
끝이라는 덧없는 말을 이리 정성스레 정의하려는 모습이 마음을 울리는.
'조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르막길 (0) | 2022.03.10 |
|---|---|
| 우리집 로몬 (0) | 2022.03.10 |
| 같이 걸을까 (0) | 2022.02.12 |
| 수구초심/ 이 솔로몬 (0) | 2021.12.09 |
| 둥그스름한 마음/ 이솔로몬 (0) | 2021.11.29 |



